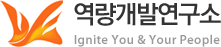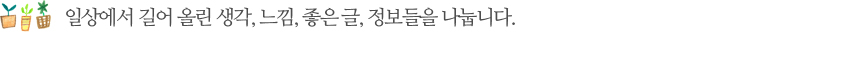
나무 옹이로부터 배우다
HIT 1056 / 정은실 / 2007-10-25
지난 주말에 `바탕`에 갔더니 장작으로 쓸 나무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도끼를 들었지만,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집중력과 힘을 보여주리라 생각하며 제가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맘대로 되지 않더군요. ^^ 도끼는 생각했던 것보다 제법 무거웠고 나름대로 힘 있게 내려쳤지만 장작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시원스럽게 두 토막이 나는 대신에, 여러 번의 도끼질에 이리 저리 볼품없이 쪼개졌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시던 바탕지기 김용달 선생님이, `옛말에 서울 사위가 팬 장작이 더 잘 탄다`는 말이 있다며 위로를 하셨습니다. 절반으로 쪼개진 장작보다 조각 조각 부서진 것같이 쪼개진 장작이 타기는 더 잘 탄다는군요. 하지만 저희 식구들의 도끼질이 영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시더니 조근조근 장작 패는 법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유난히 마음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나무는 옹이가 있는 부분이 단단합니다. 옹이가 있는 쪽부터 도끼질을 먼저 하면 잘 쪼개지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옹이는 사람으로치면 깊은 심리적 외상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가 자신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것이 옹이입니다. 그 옹이가 나무의 다른 부분보다 더 단단한 것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후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깊은 심리적 외상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잘 이겨내면 사람들은 더 강인해집니다.
한 번 생긴 상처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현명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의미는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라거나 혹은 그냥 아픈채로 시간에 맡기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상처로부터 배우고 그 상처를 자신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기 안에 단단한 옹이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옹이는 또 다른 상처에 쉽게 부서지지 않는 강인함을 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옹이를 안고 내 나이테를 만들며 성장하고 있나 가만히 더듬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