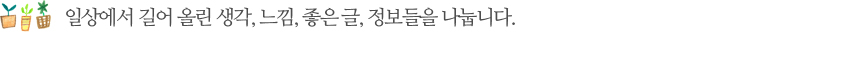
아홉 개의 우리집 화분들 이야기
HIT 1347 / 정은실 / 2007-11-01
오늘은 무슨 글을 쓸까 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니 딱히 쓸 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문득 거실에 있는 화분 아홉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은 화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실 오른쪽을 지키고 있는 `자바`는 가장 오래 전부터 우리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식물을 보는 안목이 제대로 없어서 병약한 자바를 샀던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 못했던 것인지 우리 집에 와서 몇 달간 계속 노랗게 잎을 떨어뜨리고 거의 대머리처럼 되어가다가 식물 영양제를 맞고 겨우 기운을 차린 녀석입니다. 원래 줄기가 약해서 거의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친정아버지가 끈을 서로 연결해줘서 열대여섯 개의 줄기들이 서로 의지하며 한 나무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키가 천정까지 닿으려고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나 가끔 고민이 됩니다. 바깥에 심어주면 어떨까 했는데, 집안에서만 자란 식물은 밖에 나가면 거의 죽는 경우가 많다는군요. 그렇다고 저 무거운 녀석을 조금씩 적응훈련을 시키기도 그렇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처럼 다소 어수선한 자바의 반대쪽에 `폴리샤스`가 단아하고 곱게 서 있습니다. 저 폴리샤스도 한 번은 물주는 것을 잊어버려서 온통 노란 단풍이 들어 거의 다 떨어져버렸다가 역시 식물 영양제를 맞고 회생을 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조금씩 시들시들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바빠서 한 이틀쯤을 미뤄버렸더니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지 순식간에 말라버리더군요. 얼마나 애를 썼던 것인지 영양제를 줬지만 다시 살아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한 상처는 때로 시간을 필요로 하나 봅니다.
`폴리샤스`의 오른쪽에는 `하니선인장`이 있습니다. 1-2주일에 한 번씩 물을 마셔야 하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하니선인장은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먹습니다. 몇 달 전에, 새끼 손톱만한 새싹이 새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경이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미(?)한테 눌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작은 새싹이 어미를 밀치며 자라나더군요. 그 새싹을 꺾어놓은 것은 하니의 어미가 아니라 개구장이 우리 아이들이 던진 공이었습니다. 흉하게 싹이 부러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자라서 하니선인장은 화분갈이를 해야할 만큼 크게 자랐습니다. 완전한 것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하니선인장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니선인장 오른쪽에는 `사랑초`가 있습니다. 밤이면 잎들이 서로 마주 붙는다고 해서 사랑초랍니다. 분홍색 꽃도 가끔 피지만 짙은 자주색의 하트모양을 닮은 잎들이 평소에도 꽃처럼 예쁩니다. 이 녀석도 몇 달 전에 잎에 병이 생겨서 하얗게 말라 가길래 마음이 아팠지만 뿌리만 남겨 놓고 모조리 다 베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보기좋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랑초 옆에는 제가 제일 경이롭게 생각하는 `꽃기린` 이 있습니다. 사철 내내 빨간 꽃을 앙증맞게 피우고 있는 선인장입니다. 2년 전쯤 이 녀석은 아름다운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생선가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물을 줘도 새로 잎도 피우지 않고 거의 죽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모습으로는 좋은 화분에 옮겨주는 것도 사치스러워보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 흙과 화분으로 갈아주었더니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서 전혀 다른 식물 같은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새로 윤기 나는 싹을 피워 올리고 꽃까지 피웠습니다. 꽃기린은 저에게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준 녀석입니다. 물론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중에도 영양분 있는 흙이라는 좋은 기회를 만날 때까지 그 한웅큼의 척박한 흙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은 것은 꽃기린 자신의 생명력이겠지요.
꽃기린 뒤로는 `이름을 모르는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는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가 하나 사주신 화분입니다. 제 크기에 비해서 화분이 작고 물을 많이 먹는 녀석인데 다른 식물들이 2주일에 한 번 물을 먹는 통에 가끔 물을 얻어먹지 못해서 고생을 하는 녀석입니다. 심하게 목마른 신호를 보내야 제가 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 최근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주일마다 물을 주지 않아도 예전보다 생생한 것 같습니다. 적응을 한 것일까요?
꽃기린 옆에는 참 건강하게 생긴 `금전수` 가 있습니다. `돈나무`라고도 불린다는 이 녀석은 개업한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음지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서 거실 구석에 있었던 조화를 치우고 들여놨던 녀석입니다. 음지에만 두는 것이 안쓰러워서 햇볕이 드는 곳으로 옮겼는데 햇볕에서도 잘 자랍니다. 몇 달 전에 금전수가 새 잎을 피우는 것을 보고 날마다 구경하며 경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새 순이 죽순처럼 뻗어 올라오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먼지도 제대로 닦아 주지 않는데도 금전수의 잎은 참 윤기가 납니다.
하니선인장 앞으로는 명찰을 받지 못해 `이름을 잊어버린 같은 품종의 화분 두 개` 가 있습니다. 같은 품종인데 하나는 보라색 꽃, 하나는 흰색 꽃을 피운 것이 너무 예뻐서 샀던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크기였던 두 식물이 요즘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는 잎새도 듬성듬성하고 힘이 없는 반면, 다른 하나는 잎새도 무성하고 빳빳하게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힘이 없는 화분은 여러 번 꽃을 피우느라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꽃을 보며 저는 즐거웠지만 꽃 피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지금은 다소 지쳐있는 그 모습이 참 생각을 많이 일으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전화기 옆에 있는 `신고디움`이 있군요. 저 신고디움은 아마 우리 집에만 있을 겁니다. 화분가게에 가면 저렇게 큰 신고디움은 없습니다. 작은 화분 위에 소복하게 덮여 있는 모습이 예쁜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집 신고디움이 좋습니다. 삐쭉하고 엉성한 모습이지만 그 성장의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화분 이야기를 쓰면서 오늘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홉 개 화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하나 쓰다 보니 말이 많아졌습니다. 종류가 다르니 당연한 말이지만, 저 화분들은 잎을 피워 올리는 모습도 다르고 물을 필요로 하는 기간도 다르고 물이 부족할 때 보이는 모습들도 다릅니다.
식물들 하나하나가 그 성장의 과정과 특성을 통해서 평소 저에게 여러 생각을 불러일으키고는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오늘은 저 아홉 식물들 전체가 `다름`과 `다양성`에 대해서 저에게 말을 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