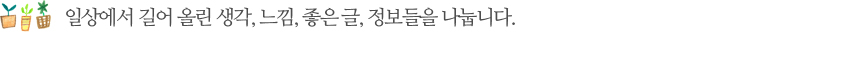
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다 이쁜 새끼들인데...`
HIT 609 / 이한숙 / 2007-09-26
명절 지내러 온 친척들 다 내려가고 한산한 추석 오후를 몇 편의 영화로 보낸다.
싸움의 발단은 한 장의 원피스다. 큰 애가 옷 정리하다 원피스를 찾아냈고, 둘은 그것을 내일 서로 입겠다고 주장한다. 그 원피스는 둘이 공동 투자해 산 것인데 그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해 한 번도 입지 못했었다. 서로 양보를 못하겠다고 시작된 싸움이 이전의 묵은 감정들까지 다 헤집어놓을 만큼 큰 싸움이 되었다. 이제 누구의 중재도 필요 없다. 둘 다 서로 너무 억울해서 싸움에 목숨을 건다. 언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런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둘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잠시 고민을 한다. 싸움 끝을 알기 때문에 일단 참아 보기로 한다. 그러나 두 아이의 격앙된 대응이 서서히 내 안의 화를 돋군다. 드디어 그 아이들 싸움에 개입한다. 그러나 그 애들 앞에 내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 애들 싸움의 불꽃이 커진다. 엄마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드디어 내 화가 폭발한다. 다 들어가라고 소리친다.
그 소란 속에서도 컴퓨터 게임에만 매달려있는 큰 애에게까지 화의 불똥이 튄다. `대학생이란 놈이 어떻게 손에 책 들려 있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 아직도 두 딸은 서로 억울하고 할 말이 많다. 모두가 서로 너무 격앙된 상태가 된다.
막무가내로 두 딸을 밀어 방에 들여보내고 나도 내 방에 들어와 노트북 앞에 이렇게 앉는다. 물끄러미 나를 바라본다. 아직 내 안에 존재하는, 가끔 이처럼 소용돌이치는 분노가 보인다. 한 번 터지면 제어가 안 되는, 위험한 폭탄처럼 분노는 거기 그렇게 있다. 근사한 매너로 잘 제어하고 있다고, 아니 잘 해결하고 있다고, 이쯤 되면 좀 자유로와졌다고 믿었던 내 속에, 분노는 그 두꺼운 뿌리를 거두지 않고 그대로 있다. 깊숙히 박혀서 필요할 때는 언제나 밖으로 나와 상대를 해하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할 자세를 하고. 턱없이 화를 내고 나면 이렇게 참담한 심정이 되는 것을.
아이들이 내가 감춘 옷을 찾는 기미가 보인다. 원피스는 주방 장식장 서랍에 넣어두었다.
‘엄마, 옷 어디다 뒀어?’
‘둘이 화해하고 누가 입을 건지 결정이 되면 말해.’
‘내가 입을거야.’ 동시에 둘이 대답한다.
‘됐어, 나가봐.’
‘옷 어디다 뒀냐니까.’
‘밖에 던져버렸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깟 옷 하나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싸우는데 그럼 그걸 그냥 둔단 말이니?’
‘정말 버렸다고? 그럼 돈으로 줘, 내가 그거 사느라고 쓴 돈 줘!’ – 큰 딸
‘아니지, 엄마가 그걸 버렸을 리가 없어.’- 작은 딸
‘정말 버렸다니까. 나가서 찾아봐 주방 베란다 밖으로 던졌으니까.’
둘 다 설마하며 아파트 밖으로 내려간다. 별 수 없다. 서랍에서 옷을 꺼내 밖으로 던진다. 그. 런. 데.… 그 옷이 떨어지다 6층 베란다에 걸려버렸다. ‘아우, 이런!’ 둘은 이미 아래서 옷을 찾고 있다. ‘얘들아, 지금 보니 옷이 6층에 걸렸다.’ 다시 올라온 아이들, 엄마가 책임지라며 이제는 둘 다 공동의 적이 된 나를 향해 식식댄다.
주방이 소란스럽다. 6층 베란다에 걸려 있는 옷을 아래로 떨어뜨려 보려고 옷을 여러 개 묶어 길게 늘어뜨려 흔들고 있는 큰 딸, 옆에서 작은 딸이 훈수를 두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나, 기겁을 한다. 몸을 너무 밖으로 기울인 두 아이가 몹시 위험해 보인다. ‘야, 위험해 물러 서!’ 그러나 곧 이어 두 아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웃음이 난다. 큰 딸이 하던 일을 이제는 내가 한다. 머리 좋게도, 아래에 옷걸이를 걸어 놓았다, 원피스가 걸리면 끌어 올리려고. 언제 싸웠냐는 듯 셋이 한 목표를 향해 협동한다. 걸린 옷은 안 떨어지고 끝에 매단 옷걸이가 7층 베란다 난간에 걸려 움직이지 않는다.
7층 아저씨, 주방에 나왔다가 밖에서 일렁이는 뭔가를 보고 내다 본다. 옷걸이가 걸린 걸 보고 잡아당긴다. 고개를 숙이고 아저씨를 향해 소리친다.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한다. 아저씨, 걸린 옷걸이를 빼준다.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한다.
‘안되겠다. 6층으로 직접 가야지.’ 늘어뜨린 옷을 다 걷어 올린다. 시계를 본다, 11시 30분이다. 먼저 아파트 마당에 내려가 6층 거실에 아직 불이 켜져 있나 확인하다. 다행히 불이 켜져 있다. 6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다. 기척이 없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지’ 생각하는 순간, 그냥 올라가면 밤새 큰 딸이 얼마나 사람을 볶을 것인지 아찔해진다. 용기를 내어 다시 누른다. 한참 있다 인터폰으로 6층 아주머니의 말소리가 들린다. 사정을 간단히 말한다. 조금 후, 아주머니, 문을 열고 옷을 건네준다. ‘아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다.
엄마를 기다리는 딸들의 표정이 비장하다. 옷을 치켜들자 이내 무안과 기쁨으로 빛난다. ‘엄마 안 올라 오길래 여태 욕먹고 있는 줄 알았네.’ – 작은 딸
내 방에 모인 두 딸, 이제 평상심을 완전히 되찾고 다시 상냥하게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엄마 앞에서 버젓이 의식도 안하고 싸우는 게 엄마를 무시하는 거라고 소리치던 나도, 돈 내놓으라고 분에 차서 요구하던 큰 딸도 그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듯이 태평하다.
아무 것도 아닌 일에, 마치 타오르는 불 속에 기름을 부은 듯 화의 화염에 휩싸여 순식 간에 이성을 잃는 것, 그것은 악의 장난이다. 이렇게 평상심을 찾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편안한 엄마 앞에서는 의식 안하고 제 멋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을...
큰 애도 엄마 집안 일 안도와 주는 게 미안해 오늘 두 번이나 냄새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지 않았나,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잊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도록 엄마 손길 한 번 의지 안하고 혼자서 다 해낸 아들인데,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다 이쁜 새끼들인데… 왜 내가 그토록 화를 낸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