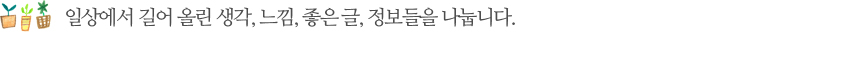
도토리묵을 쑤시던 어머님 모습을 기억하다가
HIT 1139 / 정은실 / 2009-01-08
오늘은 문득 돌아가신 어머님이 만들어주시던 도토리묵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이 찾아가면 한해에 한 번 정도 도토리묵을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산책길에 조금씩 주워 모은 도토리 껍질을 손수 벗기고 말려서 얻는 가루라고 하셨습니다.
사먹는 도토리묵과는 다를 것이라는 말씀에 옆에 서서 지켜보던 나는
도토리 가루의 양과 물을 넣는 비율, 불의 세기, 끓이는 시간을 궁금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책길에 모은 도토리로 재미 삼아 어쩌다 한 번씩 묵을 쑤시던 어머님은
그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하여 묵 쑤기를 겁내시지도 않았습니다.
가루를 물에 풀어서 계속 저어가며 끓이다가 농도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하고,
끓으면서도 타지 않을 정도로 불의 세기를 약하게 조절해가는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묵의 색깔과 농도를 잘 살피시면서,
천천히 약한 불로 저어가며 그 옆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쉬워보이던 일이 어느 날 어머님이 나에게 젓는 것을 맡기셨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물이 들어간 도토리 가루는 얼마나 불에 민감하던지,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급해진 마음에 잠시 불을 세게 하면 가루는 금방 걸쭉한 미음같이 되더니
냄비에 눌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물이 더 필요한 것인지, 언제가 불을 꺼야 할 때인지를 나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셨던 묵 쑤는 일을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
어머님은 느긋하게 하셨지만 그 일에서 잠시도 주의를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의 느낌으로 가장 적합한 농도를 알아차리고,
걸쭉해지던 묵에서 어느 때 투명한 느낌이 나면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불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묽으면 묽은 대로 진하면 진한대로 묵 맛을 즐기실 줄 아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료가 자식들이 오면 특별한 것을 먹이고 싶어서
한 톨 한 톨 모아 만들어놓으셨던 도토리 가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쒀 주시는 묵은 그때마다 맛이 달랐지만,
어머님의 정성이 묻어 있었고 밖에서 파는 도토리묵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유의 진한 맛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1년, 그리고 결혼 후 8년을 만나 뵌 분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내밀었을 뿐이니
어머님을 뵌 날들은 사실 몇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기억들 중의 많은 부분이 어머님이 만들어주셨던 음식과 두런두런 해주시던 말씀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요리에 많은 시간을 쓰지도 않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즐기지 않는 나는
나중에 내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기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가장 정성과 애정을 들인 일이 가까운 이들의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아마도 내 아이들은 함께 책을 읽고 대화하고 글을 쓰던 엄마 모습을 기억을 하게 될까요... ^^
